오랜 노력 끝에 꿈에 그리던 회사의 관리직으로 입사한 박씨의 기쁨은 잠시였다. 그에게는 매일의 출근이 설렘인 동시에 거대한 벽처럼 느껴진다. 목발을 짚고 생활하는 그가 양손에 서류나 비품 등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간단한 업무조차 '근로지원인'의 도움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워, 그의 이름은 하염없는 대기자 명단에 놓여있다.
박씨처럼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근로지원인을 애타게 기다리며 출근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중증장애인이 전남에만 70여 명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가 이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원책인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막혀 절실한 이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희망이자 절망입니다. 저의 능력을 믿고 뽑아준 회사에 보답하고 싶은데, 손을 자유롭게 쓰기 힘들어 자료를 정리하고 비품을 옮기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동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저 자신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최근 한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업한 뇌병변장애인 강씨는 어렵게 잡은 기회를 이대로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는 "근로지원인만 있다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제 꿈이 사그라지지 않게, 제발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대기자 명단에 오른 70여 명의 사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일하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다. 이들에게 근로지원인 없는 하루하루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은 왜 이토록 간절한 존재일까? 이는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과 자립, 꿈을 지탱하는 '날개'와 같기 때문이다.
첫째는 '도움받는 동료'가 아닌 '유능한 동료'로 만들어준다. 근로지원인은 장애로 인한 막혀있는 장벽을 허물어준다. 예를 들어, 재능 있는 사무직원이 서류 이동 등에 해방되어 핵심 업무에 몰입하게 돕는다. 이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직업인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게 된다.
둘째는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생명줄'이다. 지원 없이는 사소한 업무 하나에도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곧 심리적 위축과 신체적 소진으로 이어진다. 근로지원인은 이들이 지쳐서 직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근속하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생명줄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예산 부족'이라는 네 글자로 귀결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 의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지만, 제도가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대기자분들의 절실한 사연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애쓰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절규에 답해야 할 때다. 7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예산이라는 벽 앞에서 자신의 꿈을 접지 않도록, 이들이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출근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관심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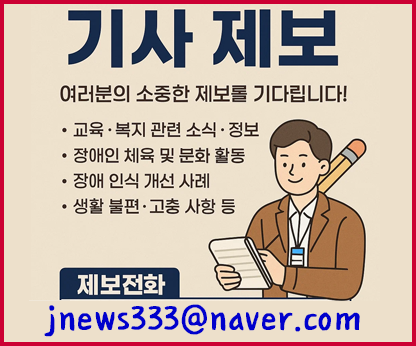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